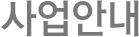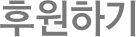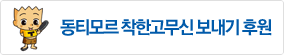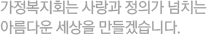|
푸른 하늘이 화창하게 펼쳐진 포항. 예쁜 하늘을 마음 편히 바라볼 수 없는 가정이 있다. 집 안 몇몇 창문엔 커다란 천들이 누군가의 눈을 피해야 하는 듯 필사적으로 외부 빛을 막고 있다. 거실에는 정리되지 못한 옷들과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내려앉기 일보 직전인 싱크대 밑엔 컵라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. 그 속에서 초등학생 딸들은 어둠이 익숙한 듯 말없이 찰흙 놀이를 하고 있었다.
진선 씨의 유일한 희망은 20세 큰딸, 12세와 9세인 둘째와 막내. 이런 세 딸에게 진선 씨는 숨는 법만 가르쳐왔다.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나거나 복도에 발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은 얼음이 된다. 누가 문을 두드리기라도 하면 집 곳곳에 웅크려 숨어 입을 틀어막는다. 빚 독촉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야 했던 탓이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