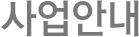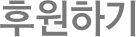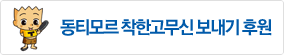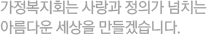|
◆ 새 출발 꿈꾸며 포항에 정착
그 즈음 포항에 기회가 있을 거란 얘기를 들었다. 배달, 일용직 등 일자리가 꽤 있다는 동료의 추천이었다. 2018년 2월 가족들과 함께 포항으로 향했다. 그러나 지진의 여파가 남아있던 새 터전은 사정이 좋지 않았다. 불경기에 일자리는 많지 않았고 배를 타고 나가 그물 작업을 해도 하루 5만원을 손에 쥐기 어려울 만큼 벌이도 넉넉지 않았다.
결국 숨을 못 쉴 정도가 돼서야 응급실에 실려 갔지만 포항에 있는 병원 서너 군데를 돌아도 원인을 밝힐 수 없었다.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됐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