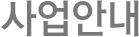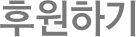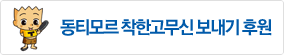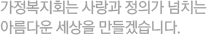|
장애 앞에 세상은 성난 파도를 맨몸으로 맞선 것만 같이 아찔했다. 저만치 나아가는 남들을 먼발치에 서서 구경만 했다. 서서히 멀어 버린 눈과 귀는 황광자(56) 씨의 손발을 묶어버리더니 마음마저 잠식해 들어갔다.
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어 기억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은 탓일까. 황씨는 둘째가 곁을 떠났을 때의 그 시린 느낌을 잊지 못한 채 20년째 몸서리치고 있다. 황 씨는 "앞이 안 보여 성당을 갈 수 없게 되고 나서 부터는 집에서 매일 안정을 빌었다"며 "눈을 떠도 감아도 아이의 모습이 잔상에 남는다"고 말했다.
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던 황 씨의 얼굴이 딸 이야기에 처음으로 환해졌다. "우리 딸 서울 백화점에서 물건 팔아요. 아주 예뻐. 시집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… 집이 타버린 뒤로는 이제 딸이 문경에 안 올까봐 걱정이야… " 이주형 기자 coolee@imaeil.com 가정복지회는 매일신문과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지원하는 '이웃사랑'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대구경북 거주자로 진짜!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주세요. 전화 053.287.007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