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김기영(가명‧39) 씨의 출근길은 늘 땀 한 바가지와 함께 한다. 일반 직장인들보다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제시간에 일터에 도착할 수 있다. 안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왼쪽 눈이 실명돼 남은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봐야 하는 탓이다.
저 멀리서 아른거리는 평범한 일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기영 씨는 오늘도 가방끈을 꽉 부여잡고 일터로 향한다. 가정복지회는 매일신문과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지원하는 '이웃사랑'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성금은 소개된 가정에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. |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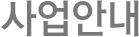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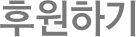



.jpg)






